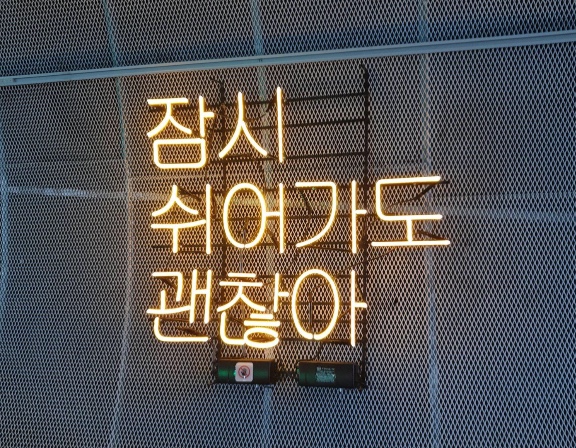크게는 비서를 집요하게 성추행하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 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직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쓴 단체의 이야기부터, 작게는 지도해야 할 대상을 연애대상으로 생각하여 불륜을 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을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청소년지도사, 대의적인 명분으로 관장 타이틀만 달아놓고 외부강사를 뛰는 몇몇 기관 관장들, 더 개인적으로는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 풍해라'라는 옛 속담을 철저하게 실행했던 대학교 학우들과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망한 적이 없었다. 자칭 전문가들보다 쿠팡 물류센터와 백화점 팝업스토어 같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직종에서 일했던 경험이 나로서는 훨씬 더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 철학을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지킬 개똥철학조차 없었던 것인가.
어느 기관 면접을 들어갔을 때 일이었다. 스펙도 앞선 지원자보다 떨어지고, 경력도 부족했었기에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내 철학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기관 종사자가 청소년들에게 대놓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에 실망한 적이 있었고, 일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면접관(아마 팀장이나 부장 직급이었을 것이다)이 내게 말하길, "어딜 가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느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이니 지원자가 항상 감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내가 바란 대답은 이런 기초적인 사회생활 이야기가 아니었다. 청소년지도사라면 으레 고민해야 할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 '청소년을 생각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어디 막노동판에서도 시시껄렁할 이야기라고 웃어넘길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지도자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들의 함부로 말하고 충동대로 행동하는 태도를, 어찌 '어딜 가나 있는 동료들 간의 의견 충돌'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학부생 시절 교수님은 항상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했다. 어떤 난관에도 철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초심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막상 그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처음으로 내디딘 필드는 썩어버린 사람들의 썩어버린 생각으로 돌아가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최상단 타이틀에 올려진 비전은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세상이었다. 내 기준, 교수님의 기준이 너무 도달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목표였던 걸까? 가슴속에 철학을 품고 청소년들을 바라보자는 그 단순하기 그지없는 목표가?
고등학생 시절, 모 인서울 괜찮은 대학교의 홍보지를 심심해서 읽어본 적이 있었다. 다른 학과들은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이런 진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를 주로 설명해 놓았다면, 철학과는 '우리 과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학부생들의 취업을 장려합니다'를 대놓고 써 놓았더라. 친구들끼리 보면서 '너무 직설적이지 않냐'라고 무진장 웃어댔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철학을 거창한 수식어 없이 '굶어 죽기 딱 좋은' 학문이라는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한 면이 아닐까. 철학 없는 사회. 결국 우리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철학 따위 내팽개치고 같이 썩은 숨이나 내뱉고 있는 짐승이 되어 버렸다.
'오피니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때로는 언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결단도 필요하다. (0) | 2021.03.18 |
|---|---|
| 폭력의 연대기 - 학교 밖으로 향하는 학교폭력과 추악한 모범생 (0) | 2019.05.28 |
| 심리상담과 직업윤리 (0) | 2019.05.04 |